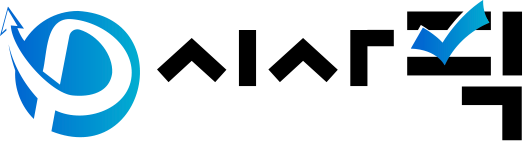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지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고, 가장 오래된 생명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다보니, 인류는 지구가 생명체인줄 모르고 지내왔다.
20세기에 인류가 환경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하는 듯 했으나, 그래도 인류는 여전히 지구를 사람 사는 유익한 공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구 전체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중심의 관점이 아닌 지구 중심의 관점에서 지구를 환경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지금의 지구가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많이 늙었고, 특히 최근 급속도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인류는 지구에 수천 년 전 4대문명이 시작된 것을 문명의 시작이라고 좋아했지만, 지구 관점에서는 어린 나이의 지구에 4개의 균이 지구 피부에 기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는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에 기생하면서 지구를 병들게 하는 기생충이라는 말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기계를 만들고, 교역을 하면서 발전해온 모든 것이 지구 관점에서는 기생충이 번성하여 점점 병들고 쇠약해지는 과정이었다.
기생충 종류도 황색 기생충, 백색 기생충, 흑색 기생충으로 나뉘어져, 각자 특성을 가지고 지구를 힘들게 했고, 최근에는 3개의 기생충이 서로 연합하여 지구를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지구 생명체가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얼마 전까지는 기생충 인류가 한 번 걸리면 살아남지 못하는 암이라는 강한 처방을 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극약처방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아는 권사님이 폐암 치료를 하기 위해 우이천 산책을 하면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허리가 안 좋은 사람도, 몸이 허약한 사람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열심히 산책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전해왔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소나무도 살기 위해 버티고 있고, 다리가 부러진 비둘기도 살기 위해 안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병을 고치기 위해 산책하는 권사님 자신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 위로가 됐다.”고도 했다.
나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권사님이 살아 있어야 살 수 있으니, 암세포가 영리하다면 자신도 오래 살기 위해 권사님의 몸을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우리 인류가 스스로를 지구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구가 이미 엄청나게 커진 기생충 인류를 박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생충인 인류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지구 생명체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다.
지구 생명체가 죽으면 인류도 다 죽기 때문이다.
지구 생명체는 앞으로도 위협을 느낄 때마다, 기생충 인류를 없애기 위해 더 강도 높은 극약처방을 할 것이다.
거대한 생명체 지구에 기생하는 인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류가 인류끼리도 서로 기생하면서 사는 기생 원리 속에 들어 있는 것 같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지구를 인류가 살아가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기생충 인류를 박멸하기 위해 애쓰는 거대한 생명체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구상에서 인류는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기생충의 최강자이기도 하다.
[단상]
혹시 누군가에 기생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어딘가에 기생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